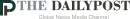ㅣ데일리포스트=김정은 기자ㅣ파리지옥, 끈끈이주걱, 네펜데스 같은 식충식물은 곤충을 잡아먹는 독특한 생존 전략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일부는 소형 포유류나 양서류까지 사냥할 정도로 강력한 포획력을 지녔지만, 이들이 왜 공룡처럼 거대한 식물로 진화하지 않았는지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였다.
이 질문에 대해 화석 및 자연사 전문 과학 칼럼니스트 라일리 블랙(Riley Black) 씨가 스미소니언 매거진(Smithsonian Magazine)에 해설했다. 핵심은 광합성과 육식 간의 균형, 그리고 그에 따르는 생태적 비용이다.
◆ 곤충을 잘 잡을수록 느려지는 성장
지금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식충식물은 광합성 기능을 일부 희생하는 대신 포식 능력에 특화된 결과, 생체 크기 성장에 제한이 생긴다.
다양한 식충식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곤충을 잡는 잎 구조일수록 빛을 흡수하는 효율이 떨어졌고, 이산화탄소를 고정하는 능력도 약화돼 있었다. 즉, 곤충을 잡는 능력이 커질수록 광합성 효율은 낮아지고, 이로 인해 식물의 크기와 성장 속도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파리지옥은 덫을 닫는 데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하며, 포획한 벌레를 분해하고 흡수하는 과정에도 추가적인 자원이 필요하다. 연구팀은 이러한 구조적 특화가 식물 전체의 에너지 예산에 부담을 주며, 결과적으로 ‘거대화’를 막는 진화적 제동장치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 육식의 대가, 환경이 만든 선택
스미소니언 매거진이 인용한 전문가들도 이와 같은 관점을 지지한다. 네이티브 플랜츠 트러스트의 식물학자 아론 엠스는 “식충식물은 주로 질소나 인 같은 영양소가 부족한 척박한 토양에 적응해 진화했다”며 “곤충을 잡아 생존할 수는 있었지만, 많은 자원이 필요한 대형 식물로 진화하기엔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충식물이 주로 서식하는 곳은 습지나 열대우림처럼 자원이 제한되고 기후가 불안정한 지역이다. 이런 환경에서는 빠르게 자라거나 덩치를 키우기보다는, 몸집을 작게 유지하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이 더 유리하다.

흥미로운 점은, 식충식물의 진화 역사가 6천만 년 이상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작고 제한적인 형태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다. 일부 열대우림 지역의 네펜데스 속 식물이 소형 동물을 잡을 만큼 큰 포획 기관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이는 식물 전체가 대형화된 것이 아니라 포획기관만 국소적으로 발달한 예외적 사례일 뿐이다.
결국 식충식물은 ‘곤충을 먹는 식물’이라는 독특한 전략을 택했지만, 그 대가로 일반 식물보다 느리고 제한된 성장을 감수해야 했다. 이는 진화 과정에서 자주 관찰되는 ‘트레이드오프’의 대표적 사례로, 하나의 능력을 강화하면 다른 능력을 희생해야 한다는 생물학적 원리를 잘 보여준다.
이는 식충식물의 독특한 생존 방식이 단순한 자연현상을 넘어, 생태계 적응과 진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기후 변화가 가속화되는 시대에 이들 식물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 나갈지도 향후 연구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 거대 초식 공룡의 식탐, 비밀은 '안 씹고 삼키는 소화'
- 펭귄의 분비물, 남극 기후의 숨은 조력자
- 옥수수와 나무의 변신, 생분해 친환경 세제 탄생
- '숙주 착각' 유도…기생식물, 속아서 죽었다
- 녹지 공간이 경찰 총격 사건을 줄인다?
- 진화도 U턴 한다?…갈라파고스 토마토의 ‘역진화’
- 쥐라기 시대 물고기, 오징어 삼키다 질식사
- 물속 아닌 나무 위에? 인도네시아서 신종 새우 발견
- 거북이도 기분 있다…파충류 정서 첫 입증
- 지상 생활 단 10분…코알라에게는 '죽음의 시간'
- 햇빛 충전해 스스로 빛나는 다육식물 개발
- 거대한 공룡도 작은 질병 앞에서는 무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