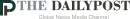ㅣ데일리포스트=김정은 기자ㅣ최근 동물 울음소리의 미묘한 차이를 판별하고 이해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돌고래·코끼리·새 등 동물의 다양한 소리에는 특정 패턴이 존재하며, 동료와 소통하기 위해 울음소리를 사용한다. 그러나 인간이 이러한 동물 울음소리의 미묘한 차이를 식별하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AI의 놀라운 발달 속에 동물 언어의 신비함도 조금씩 벗겨지고 있다. 다만 인간 언어처럼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되지 못한 상황에서 동물의 독자적인 소통 방식을 밝혀내는 일은 쉽지 않은 과정이다.
고래류 생물학자인 셰인 게로 캐나다 칼턴대 교수는 지난 20년간 고래의 의사소통 방법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으며, 고래가 가족 일원임을 나타내는 특정 울음소리를 내는 것과 향유고래도 서식 지역에 따라 울음소리에 '사투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해양 미생물학자 데이비드 그루버 박사는 향유고래의 음향 해독을 목표로 한 국제적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CETI(Cetacean Translation Initiative)'를 설립해 그동안 축적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
프로젝트 CETI는 향유고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게로 교수팀의 연구도 후원하고 있다. 프로젝트 CETI 이전부터 게로 교수는 카리브해에서 수천 시간을 보내며 동료와 함께 섬 근처에 서식하는 30마리 이상의 고래 가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왔다.
고래는 대부분 시간을 수심 2000m의 심해에서 먹이를 찾는 데 소비한다. 수심 2000m의 세계에는 빛이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사냥감을 수색할 때 '코다'(Codas)라는 마치 모스부호와 같은 클릭음으로 서로 소통한다. 때로는 코다를 30~40회 연속으로 발성해 다른 고래와 소통한다.
고래는 암컷이 이끄는 집단을 형성하는데, 각각이 독특한 식생활·사회 행동· 서식지 사용법을 가지고 있다. 수천 마리의 개체로 구성되는 집단도 있으며 소리의 높낮이와 음색이 다른 사투리로 커뮤니케이션을 취하기도 한다.
게로 교수는 "고래가 서로 대화하며 노는 모습을 자주 확인했다. 소리 교환은 한 시간 동안 이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아래 영상은 고래가 의사소통에 사용하는 '코다'에 대한 설명이다.
코다의 리듬과 템포를 이해하기 위해 연구팀은 고래의 음성 녹음을 수작업으로 분석했다. 음량과 주파수 등의 특성을 분석하는 과정은 시간이 많이 소요돼, 1분짜리 녹음 데이터에서 개별 클릭음 분리까지 기존에는 약 10분 정도 걸렸다.
그러나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작업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진데다, 특정 소리가 어떤 동물이 내는 소리인지 구분하기도 쉬워졌다. 또 기존에는 기본적으로 수작업으로 개별 단어를 분류했지만, AI를 통해 고래 언어의 문장이나 대화 전체에 해당하는 코다를 찾을 수 있게 됐다.
연구팀은 "총 8719개의 코다 데이터 세트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 코다는 마치 '알파벳'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코다의 횟수나 그 간격의 미묘한 변화로 고래는 방대한 수의 코다를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해 복잡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AI를 통해 고래 발성의 특징을 밝히는 작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연구팀은 코다의 구체적 의미를 찾기 위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특정 발성법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생물은 향유고래뿐만이 아니다.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CSU) 행동생태학자인 마이클 파르도 박사는 머신러닝을 이용해 야생 아프리카 코끼리의 언어를 연구하고 있다.

연구팀에 따르면 코끼리는 울음소리로 서로 시야에서 벗어났는지 접근 중인지, 또 어미 코끼리가 새끼 코끼리와 함께 있는지 등의 정보를 전달한다. 코끼리의 울음소리라고 하면 '뿌우' 같은 코를 이용한 큰 소리를 상상하는 사람이 많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사람 귀에는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은 저주파음이 많다.
파르도 박사 연구팀은 케냐 삼부루와 암보셀리 국립공원에서 1986~2022년에 걸쳐 녹음된 아프리카코끼리의 울음소리를 머신러닝 모델로 분석해 울음소리 중에 '이름'으로 추정되는 것이 포함됐는지 확인했다.
이 머신러닝 모델에 울음소리가 어떤 개체를 불렀는지 예측하는 작업을 하게 했더니 27.5%의 정확도로 예측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 모습은 아래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프리카코끼리는 자신의 이름이 포함된 울음소리를 들으면, 그렇지 않은 울음소리와 비교해 ▲평균 128초 빨리 울음소리의 발신원에 접근하고 ▲평균 87초 빨리 자신의 울음소리를 돌려주며 ▲평소의 2.3배에 달하는 발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 히브리대 사프라 뇌과학센터(ELSC) 데이비드 오머 박사팀도 마모셋 원숭이로 비슷한 실험을 하고 있다. 연구팀은 마모셋들의 대화를 녹음해 AI로 분석한 결과, 이들이 '피콜'(phee-calls)로 알려진 일련의 음조 발성으로 서로를 식별하고 소통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서로에게 특정 이름을 붙이고 복잡하고 다양한 발성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능력은 동물들의 복잡한 뇌 메커니즘 발달을 시사한다. AI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발전 중인 이러한 연구는 동물 언어의 진화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주고,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