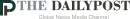ㅣ데일리포스트=김정은 기자ㅣ혼자만의 시간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재충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사회적 교류가 완전히 끊긴 채 장기간 '고립' 상태에 놓이면 상황은 달라진다.
교육 콘텐츠 플랫폼 TED-Ed는 강제된 고립이 뇌와 몸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이 상태가 길어지면 '고문'에 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뇌 기능 붕괴로 이어지는 고립의 악순환
고립이 시작되면 처음엔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히 치솟는다. 시간이 지나도 이 반응이 꺼지지 않으면 만성 스트레스로 굳어지고, 감정을 안정시키는 사회적 교류와 활동이 사라진다. 그 순간부터 '사회적 현실성(Social Reality)'이 무너진다. 자신의 생각이 사회 속에서 얼마나 타당한지 확인할 길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때 뇌 속에서는 변화가 시작된다. 대뇌변연계는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전두전피질은 점점 위축된다. 그 결과 추론·판단·집중력·기억력 같은 고차원 인지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며, 합리적 사고보다 감정과 충동이 앞서게 된다.
불안과 분노가 잦아지고, 우울증·강박·자살 충동이 고개를 든다. 심하면 망상과 환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립이 길어질수록 시간 감각은 흐릿해지고, 밤낮이 뒤바뀌거나 잠을 지나치게 자는 등 수면이 무너진다. 여기에 심계항진·두통·소화 장애·체중 감소 같은 신체 이상이 겹치며 상태를 악화시킨다.
◆ 독방의 그림자와 '사회 복귀형' 수감
미국에서 독방 제도는 17세기 퀘이커 교도들이 반성과 참회를 돕기 위해 도입했다. 그러나 작가 찰스 디킨스는 이를 "육체적 고문보다 더 끔찍하다"고 비판했다.

1980년대 들어 한때 줄었던 독방 수감은 강력한 형사 정책과 수감자 증가로 다시 확산됐다. 2019년 기준, 12만 명 이상이 창 없는 2×3m 공간에서 하루 22~24시간을 보냈다. 폭력과 무관한 경미한 사유로 독방에 보내지는 경우도 적지 않고, 특히 기존에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증상이 악화되기 쉽다.
일부 주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 아동, 임산부의 독방 수감을 금지하고 기간을 제한하지만, 법적 예외와 운영상 허점은 여전하다. TED-Ed는 이런 제도가 폭력을 줄이지 못하고 재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대안으로 주목받는 사례가 노르웨이다. 이 나라는 수감자를 단순히 격리하는 대신 사회로 복귀할 '재활 대상'으로 바라본다. 모든 수용자는 교육 과정에 참여하거나 기술·직업 훈련을 받고, 일부 시설에서는 일반 직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한다. 수감 기간에도 가족과의 접촉을 최대한 보장해 사회적 유대가 끊기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미국보다 수감자 1인당 약 5배 많은 비용이 들지만, 재범률은 20% 안팎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유지한다. 타인과의 교류와 사회참여 기회가 회복 가능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TED-Ed는 "혼자만의 시간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지만, 강제된 고립은 놀랄 만큼 광범위한 영향을 초래하며, 고립이 길어질수록 증상은 더욱 심각하고 오래 지속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