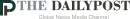ㅣ데일리포스트=김정은 기자ㅣ소중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매우 슬프고 괴로운 기분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동물들도 죽음을 애도하는 반응을 보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러한 반응이 과연 실제로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행동인지에 대해 과학전문 매체 '라이브사이언스'(Live Science)가 정리했다.
동물이 가족이나 동료의 죽음으로 깊은 슬픔을 느끼거나 정신적으로 힘들어한다는 생각은 오랫동안 비과학적인 문제로 무시되어 왔다. 하지만 동물 연구자들은 다양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1972년 탄자니아 열대우림 깊숙한 곳에 사는 늙은 침팬지 플로(Flo)가 죽은 후 아들 침팬지 플린트(Flint)는 갑자기 무기력해지고 식욕을 읽고 무리에서 점차 고립되어 갔다.

아프리카 침팬지를 연구한 동물행동학자 제인 구달(Jane Morris Goodall) 박사는 당시 영국 '선데이 타임스'(Sunday Times)에 "어머니에 대한 깊은 애정을 품고 있던 플린트는 플로의 사후 좀처럼 식사를 하지 않게 됐고, 3주 정도 지날 무렵 체중이 3분의 2 가까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플로가 죽은 지 한 달 후 극도로 수척해진 플린트도 세상을 떠났다.
잠비아에서 관찰된 한 암컷 침팬지는 죽은 어린 침팬지의 치아를 풀로 닦는 듯한 행동을 반복했다. 2017년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츠'(Scientific Reports)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이는 거의 장례식과 유사한 의식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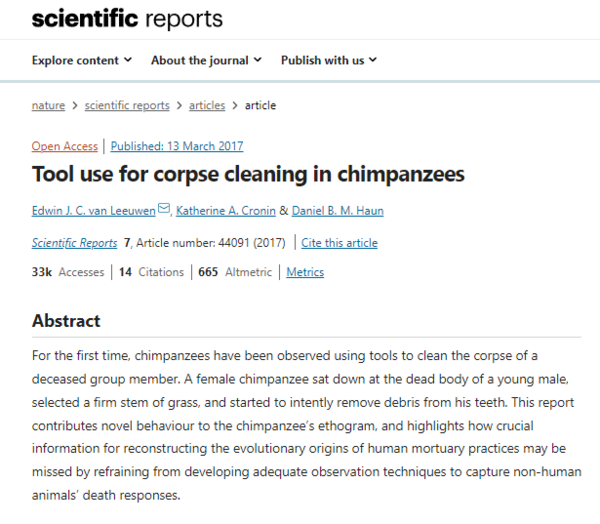
침팬지 이외에도 가족의 죽음을 슬퍼하는 동물 행동은 다수 보고되고 있다.
2010년 사바나의 어미 기린은 새끼 기린이 하이에나에게 먹혀 버린 후, 한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저 죽은 새끼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에는 암컷 범고래가 죽은 새끼 범고래를 17일 동안이나 계속 밀면서 약 1600km를 헤엄쳤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미국 워싱턴주에 위치한 고래연구센터에 따르면 범고래가 이 행위를 자발적으로 그만둔 것인지 새끼 범고래의 시신이 사라져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새끼 범고래의 사망 17일 후 어미 범고래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이 확인되었고, 고래연구센터는 “그녀의 애도 여행은 끝이 났다”고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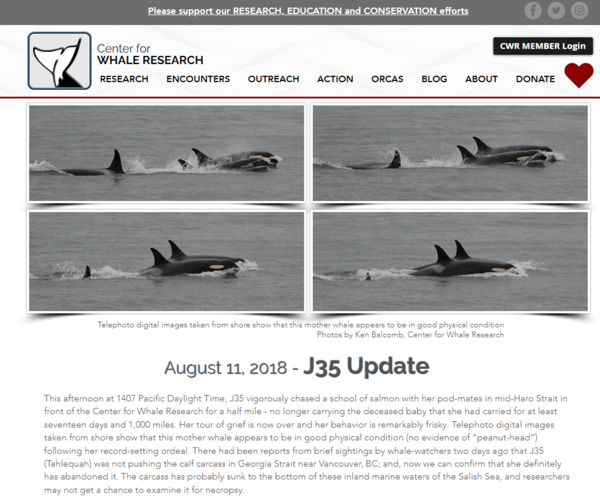
죽음과 마주했을 때 보이는 인상적인 행동은 코끼리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아프리카 코끼리는 죽은 친족의 시신 근처에 모여 고개를 숙이고 코를 땅에 붙인 채 장시간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시아 코끼리는 시신을 수많은 나뭇가지나 잎 등을 모아 매장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야생동물 무리뿐만 아니라 길들여진 동물도 죽음에 유사한 반응을 보인다. 이탈리아 수의사 겸 연구자인 스테파니아 우체두(Stefania Uccheddu) 박사는 아파서 식사를 거부하는 개를 진찰한 결과 혈액이나 심장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1주일 전 그 개의 형제가 사망한 것이 원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또 밀라노대학교 수의대가 진행한 연구에서는 애완견이 동료를 잃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설문 조사한 결과 ▲주인의 관심을 끌려고 하거나 자주 짖는다 ▲노는 빈도와 식사량이 감소했다 ▲수면 시간이 길어졌다 등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코끼리 생물학자인 산지타 포카렐(Sanjeeta Pokharel) 박사는 "죽음을 애도하는 듯한 코끼리 행동을 보면 인간 관점에서 모종의 슬픔이 뚜렷이 보인다. 하지만 그것을 슬픔이라고 불러도 좋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한다.
이어 "동물이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 일률적으로 '슬픔'이라고 표현한다면 동물을 의인화하는 것과 같다"며 연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동물들이 보이는 죽음에 대한 반응은 슬픔이 아니라, 호기심·상실로 인한 혼란·환경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공포 등에 기인할 수도 있다.
가령 미국 까마귀는 죽은 동료 까마귀를 폭력적으로 다루거나 공격하거나 교미하려는 습성을 보인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에 대해 '까마귀는 이를 통해 위험과 위협의 개념에 익숙해지고 스스로의 취약성을 배울 수 있다'고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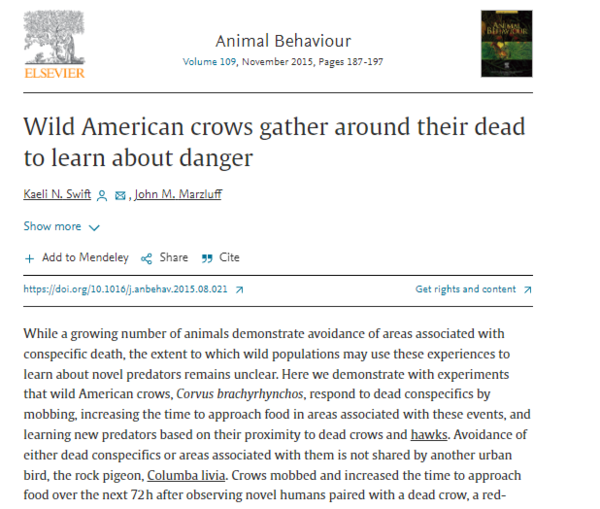
'동물은 어떻게 비통해 하는가'(How Animals Grieve)의 저자이자 인류학자인 바버라 J. 킹(Barbara J. King)은 "인간의 슬픔은 본질적인 기능의 변화, 즉 식사·수면·사교라는 통상적인 패턴에서의 벗어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슬픔의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이나 동료의 죽음으로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수십여종의 동물로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카렐 박사는 "동물 인지와 감정에 대한 연구는 크게 부족하다. 결국 동물과 소통할 수 없는 이상 결정적으로 알기 어려운 문제다. 다만 동물이 슬픔을 느끼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동물을 보다 소중히 생각하는 감정이나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