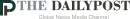ㅣ데일리포스트=김정은 기자ㅣ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은 삶의 일부이자 감정을 자극하는 강력한 문화적 언어다. 기쁨과 위로, 추억을 불러오는 힘 때문에 음악은 인류 보편의 경험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일부에게 음악은 단순한 배경 소음일 뿐이다. 음악을 들어도 즐거움이나 감동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현상을 '음악성 무쾌감증(music anhedonia)'이라고 한다.
영국 웨스트민스터대학교 신경심리학자 캐서린 러브데이(Catherine Loveday) 교수는 호주의 비영리 학술매체 더컨버세이션(The Conversation)에 기고한 글에서, 음악성 무쾌감증이 단순한 취향 문제가 아니라 뇌 연결망의 특수한 작동과 관련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 음악은 들리지만, 뇌는 반응하지 않는다
2019년 연구에 따르면 인구의 5~10%가 음악성 무쾌감증을 겪는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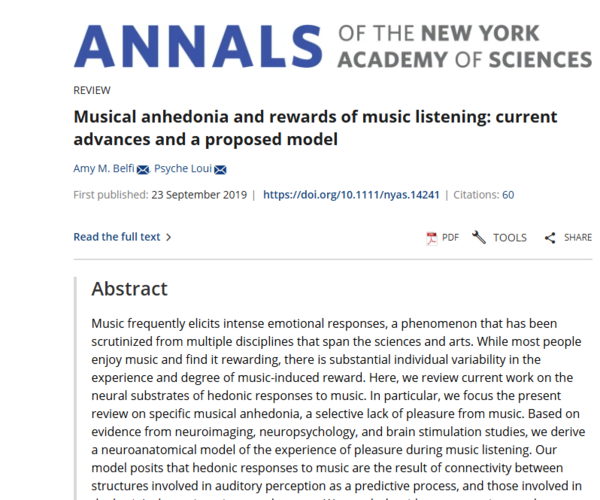
연구자들은 음악적 반응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바르셀로나식 음악 보상 질문지(BMRQ)'를 활용한다. 일상에서 얼마나 자주 음악을 듣는지, 흥얼거리는 습관이 있는지, 특정 곡을 들을 때 전율을 느끼는지 등을 묻는 방식이다. 점수가 낮으면 음악성 무쾌감증으로 분류된다.
실험실 검증에서도 차이가 뚜렷하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감정적인 음악을 들을 때 심박수, 발한, 호흡 같은 생리학적 지표가 급격히 변하지만, 무쾌감증 환자는 거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흥미로운 점은 음악 '지각' 능력 자체는 정상이라는 것이다. 멜로디와 리듬을 구별하고 장조·단조를 알아차릴 수 있지만, 음악 인식과 뇌 보상계 사이 신호 전달이 단절돼 쾌감을 느끼지 못한다. 바르셀로나대학교 연구팀이 2025년 8월 발표한 논문은 "음악을 지각하는 신경망과 보상계는 모두 정상 작동하지만, 양쪽 간 신호 전달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 음악에 무감각한 뇌, 임상 연구의 단서
음악성 무쾌감증은 단순한 취향 문제가 아니라 뇌 연결망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 일부는 우울증 등 기분장애와 연관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음식, 영화, 사교 활동 등 다른 자극에는 정상적으로 즐거움을 느낀다. 이는 음악에만 국한된 독특한 무쾌감 현상을 보여준다.
반대로 음악에 과도하게 끌리는 '하이퍼헤도닉(hyperhedonic)' 상태도 존재한다. 2025년 연구에 따르면 인구의 약 25%가 음악을 반복적으로 갈망하며, 거의 강박에 가까운 수준으로 음악을 찾는다. 이는 개인마다 음악적 감수성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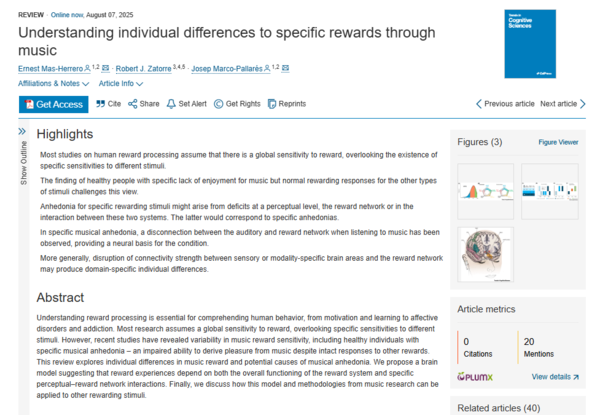
또한 뇌의 청각 네트워크와 보상계 사이 신호를 인위적으로 강화하면 음악에 대한 쾌감이 증폭될 수 있음이 2018년 연구에서 확인됐다. 이러한 발견은 음악성 무쾌감증 연구가 식이장애, 도박 중독, 성적 충동 등 보상 시스템 이상을 다루는 임상 연구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에는 유전적 요인도 주목받고 있다. 2025년 3월 발표된 연구는 음악성 무쾌감증과 특정 유전적 변이 간 연관성을 보고하며, 일부 사람이 선천적으로 음악에 무감각하게 태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러브데이 교수는 "음악은 상점, 체육관, 병원 등 일상 곳곳에 깔려 사람들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준다"며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음악이 보편적 치료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위안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