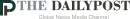ㅣ데일리포스트=김정은 기자ㅣ고도 약 10~50km 성층권에 존재하는 오존층은 태양의 유해 자외선을 흡수해 지구 생태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지구 저궤도 인공위성이 오존층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번 논문은 국제학술지 '지구물리 연구 레터스(Geophysical Research Letters)'에 게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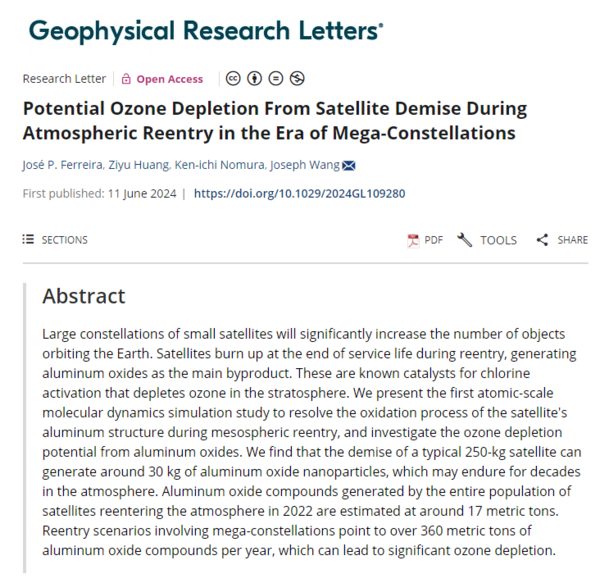
오존층은 지구 보호에 매우 중요하지만, 20세기 들어 에어컨·자동차·냉장고·선박 등의 냉매로 주로 사용된 프레온 등 염소를 포함한 화합물이 오존층을 파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하지만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 이후 프레온가스 등 오존층 파괴 물질의 사용이 제한되면서 오존층은 점차 회복되고 있다.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연구팀은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지구 저궤도 인공위성' 때문에 모처럼 회복된 오존층이 다시 파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구 저궤도에 배치된 약 8100기의 인공위성 중 약 6000기는 인공위성 기반 인터넷을 제공하는 스타링크의 운영을 위해 스페이스X가 지난 몇 년간 발사한 인공위성이다.
이미 스페이스X는 1만2000기의 스타링크 위성 발사 허가를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4만2000기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 외에 아마존 등 다른 업체도 3000기~1만3000기의 인공위성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구 저궤도에서 전개되는 인공위성은 수명이 약 5년 정도로 짧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위성을 발사해야 한다.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은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해 연소되는데, 이때 타다 남은 오염물질이 지구 대기에 퍼진다.
기존에 진행된 인공위성 오염 관련 연구는 대부분 발사 시 로켓 연료 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위성 연소 시 방출되는 오염물질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이에 연구팀은 인공위성 구성 물질의 화학조성과 결합을 모델링해 대기권 재진입 시 어떤 오염이 발생하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질량의 30%가 알루미늄인 전형적인 250kg 인공위성이 대기권 재진입으로 소진되면 약 30kg의 산화알루미늄 나노입자가 생성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산화알루미늄 나노입자는 대부분 지표에서 50~85km의 중간권에서 생성되며 오존층의 90%가 위치한 성층권까지 최대 30년에 걸쳐 도달한다.
2022년 기준 총 17톤의 산화알루미늄 나노 입자가 인공위성 연소로 생성됐다. 현재 계획된 인공위성이 모두 발사되면 그 양은 연간 360톤에 달해, 대기 중 산화알루미늄의 양은 자연 수준보다 646% 급증할 전망이다.
연구팀은 "산화알루미늄은 그 자체로 오존 분자와 화학적 반응은 나타나지 않지만 오존과 염소 사이의 파괴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성층권을 떠도는 오존 분자를 수십 년간 계속 파괴할 수 있다"며 "인공위성의 증가는 심각한 오존층 파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